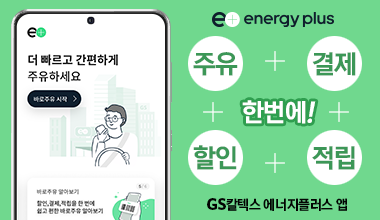Contents
계약직 직원 고용, ‘갱신기대권’ 주의해야

지난 2024년 6월 물류센터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즉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렇듯 계약직과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고용관계를 종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유소 경영자도 부당해고 이슈를 겪지 않으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둬야 한다.
주유소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근무 시간이 타 업종보다 길고 업무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는 인식이 강해 근로자들이 주유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유소 경영자 중에는 정규직 근로자 대신 기간을 정해 놓고 일하는 주유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주유소를 포함한 사업장에서는 흔히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 또는 ‘계약직’ (이하 ‘계약직 근로자’)이라 부른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입사 후 해당 근로자가 원할 때까지 재직하거나 정년이 도래할 때까지 재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대로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까지만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렇듯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외에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유소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법’상 주의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계약직 근로자와 2년 후 재계약은 ‘무기계약직’
주유소 경영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직 주유원을 고용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 계약직 주유원을 사용할 때는 해당 주유원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주유원과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해당 주유원이 매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총 2년의 근무 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번 더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년을 하루라도 넘어가는 순간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돼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유소 경영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A주유원에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 이전글
- 전문점 뺨치는 코멘트 3가지
e-Magazine
시장을 알면 수익이 보입니다!
Oil Price Highlight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 휘발유 판매가격 | 1,733.20 | -0.13 | |
| 경유 판매가격 | 1,597.84 | 0.13 | |
| 등유 판매가격 | 1,341.02 | -0.01 |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 두바이유 | 77.45 | -1.59 | -3.83 |
| WTI | 72.70 | -0.46 | -1.07 |
| 브렌트유 | 76.20 | 0.24 | -1.29 |
| 국제 휘발유 | 83.28 | -3.14 | -1.65 |
| 국제 경유 | 91.38 | -2.03 | -1.65 |
| 국제 등유 | 91.93 | -2.00 | -0.79 |








 에너지미디어 소통 채널
에너지미디어 소통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