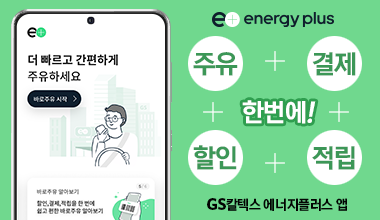Contents
‘정의로운 전환’ 기조로 주유소 구제해야

오세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현행 주유소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일정부분 부담하거나 사업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계 주유소 지원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구제하자는 것이다.
주유소산업은 1972년 ‘석유사업법’이 공포되며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80~90년대에 불어닥친 급격한 ‘마이카 붐’과 1981년 ‘3.14 조정명령’에 따른 정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소유 또는 경영 금지조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5년에는 1~3㎞ 이상으로 주유소간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던 ‘주유소 허가제’까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건설 붐이 일어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끊임없는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시절도 시간이 흘러 과거의 영광에 그치는 순간이 찾아왔다.
공급 과잉과 21세기 들어 시작된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등으로 여건이 바뀐 것이다.
문 닫을 돈도 없어 휴업 주유소 증가
2010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주유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00개의 주유소가 꾸준히 폐업해왔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총 주유소 숫자는 1만644개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주유소의 약 10%가 문을 닫은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72%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폐업하지 않은 주유소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주유소 중 63.3%의 영업이익률이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영업손실을 봤다고 하는 주유소도 18.5%에 달했다.
비공식적으로 업계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의 10% 가량은 유류 구매자금도 없어 휴업과 영업을 반복하는 실정이다.
실제 주유소가 겪고 있는 한계상황의 심각성은 폐업률 이상이라는 의미다.
‘문이라도 닫을 수 있으면 그나마 여유가 있다’는 말도 들린다.
장사가 안된다고 문을 닫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폐업할 때 주유소 경영자가 위험물시설 철거와 토양오염도 조사,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대략 1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소요된다.
문을 닫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막대한 비용이다.
결국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영자들은 휴업 후 시설을 방치한다.
이런 휴업 주유소의 수 역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e-Magazine
시장을 알면 수익이 보입니다!
Oil Price Highlight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 휘발유 판매가격 | 1,634.38 | -0.29 | |
| 경유 판매가격 | 1,501.09 | -0.41 | |
| 등유 판매가격 | 1,312.07 | -0.70 |
| 가격구분 | 당일 가격 | 전일 대비 | 전주대비 |
|---|---|---|---|
| 두바이유 | 67.60 | -1.87 | -0.54 |
| WTI | 62.79 | 0.52 | -1.89 |
| 브렌트유 | 66.55 | 0.43 | -1.41 |
| 국제 휘발유 | 76.20 | -1.37 | 1.23 |
| 국제 경유 | 81.83 | -1.58 | -0.09 |
| 국제 등유 | 81.21 | -1.35 | 0.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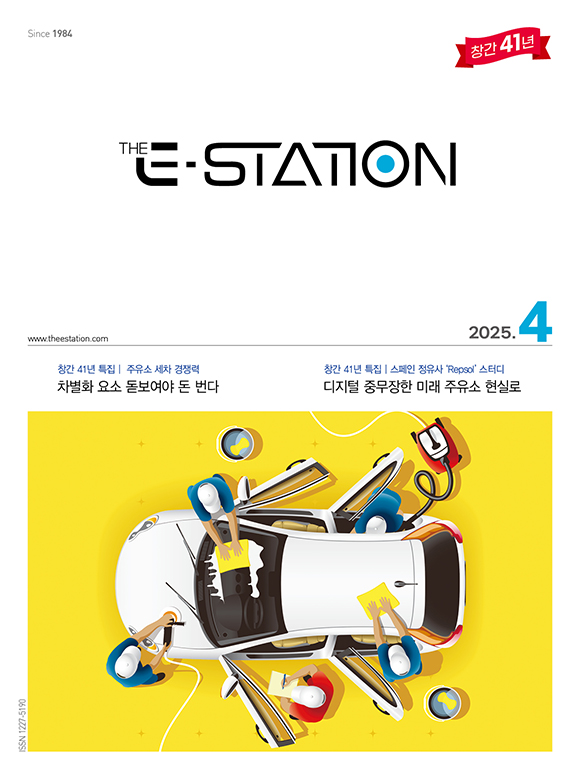




 에너지미디어 소통 채널
에너지미디어 소통 채널